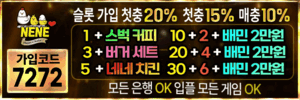내 나이 쉰넷에 1 - 9부
9
그렇게 나도 중학교 삼학년이 됐고,
키도 훌쩍 커지고 젖가슴도 제법 처녀티가 나기 시작했죠.
팔 다리부터 얼굴까지 새까맣고, 삐쩍 마르기는 했지만 읍내에서는 예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학생들이 몰래 가방에 편지를 넣어 주기도 하고 개중에는 대문 앞까지 쫓아 오면서 추근대기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경우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전교학생 중에 여자는 사분지 일도 안됐으니까요.
그러니 정선읍내에서 내가 끌던 인기가 어땠었는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여름방학이 돌아오자 나는 어떻게든 쑥골에 가서 지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방학 중에 오빠가 시골집에 다니러 라도 오지 안을까 해서지요.
방학 내내 있지는 안겠지만 그래도 이,삼일 이라도 다녀갈 거 같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 셋을 꼬드겨서 방학 동안 쑥골에 있는 우리 옛날 집에 가서 조용히 공부를 하자고 하였죠.
그 애들은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좀 산다는 집이라도 형제 서,넛이서 한 방을 써야 했고,
틈틈이 가사도 안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니 걔들에게도 꽤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물론 나는 워낙 공부를 못하는 축에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둔 상태였지만요.
아버지한테 졸라서 옛날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졸랐어요.
워낙 공부라고는 접어둔 딸이 공부하겠다는데 말릴 부모 있나요.
그리고 옛날 집도 아버지가 가끔 다니면서 손을 보아 둔 상태라 우리들이 가도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
외지인이 찾아 오는 동네도 아니고,
동네에는 같이 지내던 어른들이 계시니, 우리들이 가도 잘 돌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쑥골에서의 여름방학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너럭바위 위에는 멍석이 여름 내내 깔려 있었어요.
밤이면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이었으니까요.
낮이면 어른들은 논일 밭일 나가시고, 우리들 차지였죠.
바위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었죠.
멍석 위에 상 하나 펴 놓고 둘러 앉아 공부도 하고 개울에 들어가 물장난도 하면서,
하루 하루 정말 즐거운 날들이었어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상에 둘러 앉으면 나는 슬그머니 빠져 나와 덕수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네 엄마하고, 고추도 따고, 밭에 김도 매고 하면서,
어떻게든 덕수 오빠의 소식을 하나라도 더 얻어 들으려고 했어요.
오빠는 그 때 서울로 가서 청계천에 있는 공구상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아저씨가 워낙 마음이 좋아 야간중학교에 보내 줬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도 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가끔은 용돈도 주시는데 오빠는 그 돈을 모아 대학에 갈 거라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고 있대요.
지금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반에서 수석을 한대요.
가게 방에 다락을 들여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도 일을 하면 별도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대학까지 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방학이 돼도 고향에 올 수 없는 거죠.
오빠가 잘 지낸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한 편 오빠가 대학에 갈 거라는 말은
나에게 묘한 자극을 주었어요.
오빠가 대학에 가면,,,,,, 그러면,,,,,,,,
시골 구석의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겠나 싶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친구들 하고 같이 공부하는 상에 끼어 앉았는데,
공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내가 왜 꼴지에서 헤어나질 못했겠어요.
책만 펴면, 오빠가 서울에 있는 멋진 여자와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
괜히 심통이 나서 애들에게 화도 내보고,
혼자 물가로 가서 두 손으로 물을 퍼서 애들에게 끼얹기도 하고는 했죠.
밤에는 전깃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남수는 혼자 등잔불을 켜놓고 열두 시까지 앉아서 책을 읽고는 했죠.
나머지 셋은 개울에 내려가 옷을 홀랑 벗고 물장난을 하기도 하고,
불룩해진 젖가슴을 서로 만지면서 깔깔거리기도 했어요.
보지에는 제법 털도 자라서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도 했는데,
그 중에 순영이는 유독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잘 때는 꼭 내 옆에 붙어서 자고는 했어요.
모기장을 쳐 놓고 한 방에서 모두 자고 있는데, 순영이 슬그머니 내 손을 잡는 거에요.
나도 같이 꼭 잡아 줬더니, 몸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내 젖가슴 위로 손이 올라 와서는
부드럽게 만져주는데 뿌리치기가 싫더라고요.
내 숨이 천천히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다 들릴 거 같았어요.
순영이 내 손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자고 신호를 보내네요.
다른 애들이 깰까 봐, 조심조심 방을 나서서 느티나무 밑으로 갔어요.
동네 어른들은 이미 다 흩어져 각자 집으로 자러 가고
모기를 쫓기 위해 피워 놨던 화톳불도 이제 거의 다 꺼지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 오르더라고요.
순영이 들고 나온 홑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순영의 얼굴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두 볼을 잡고는 입술을 부딪쳐 오더라고요.
순영의 입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아마 단내라고 하는 걸 거에요.
둘이 서로 혀를 입안으로 밀어 넣고 혀를 굴려보기도 하고 빨기도 하는데 너무 달콤한 거 있죠.
입은 서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두 손은 서로의 젖가슴을 쥐고, 젖꼭지를 비틀었어요.
“으~~음, 으~~음”
누가 들을까 억지로 소리를 죽이면서도 서로의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순영이 몸을 포개오면서 내 젖가슴을 빨아 주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데요.
순영의 손이 내보지를 만지고 크리토리스를 살살 비벼대는데,,,,,,
“끄~~극, 끄~~~~억”
입을 악물고 소리를 죽이려니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순영의 손가락이 보지 구멍을 파고 들려는 거에요.
나는 도리질을 치며 거부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 그 구멍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에요.
순영도 더는 내 보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는 하지 않고, 크리토리스를 비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끄~~~윽,꺼~~~억”
드디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참았던 숨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줌을 찔끔 지린 거 같았는데,,,,,
맥이 쭉 빠지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남지 안 더라고요.
순영은 내 입술에 가볍게 키쓰를 해주고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두 손가락을 자기 보지에 넣고 쑤셔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워낙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하~~~악,하~~~학”
순영의 숨소리가 멎을 듯 해 갈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순영의 젖꼭지를 빨아줬죠.
순영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벌렁 누워 버리데요.
둘이 서로 팔 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니,
반짝거리는 별들이 하늘을 뒤 덮고 있는데 제들이 우리가 한 짓을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낯이 뜨거워 오더라고요.
가빳던 숨이 가라 안는데, 온갖 생각이 몰려오는 거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덕수 오빠가 봤다면,,,,,,
온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갑자기 순영이 미워지데요.
덮고 있던 홑이불을 잡아당겨 둘둘 말아 가지고 방으로 들어 와서는,
머리에 뒤집어 쓰고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두 눈은 퉁퉁 부었는데, 순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더군요.
순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깔거리고,,,,
나는 하루 종일 오빠네 고추 밭에 가서 고추 따는 일을 도왔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 다들 잠이 들고 나면 순영의 유혹은 계속됐고, 나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어요.
순영이 내 보지를 입으로 빨아 주고 혀로 크리토리스를 간질여 줄 때는,
내 숨은 한참씩이나 멎고는 했죠.
나도 순영의 젖가슴을 빨아주고. 내 두 손가락을 순영의 보지에 넣게 까지 되었죠.
그래도 순영의 손가락이 내보지 구멍으로 못 들어 오게 막은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는 했어요.
그렇게 그 해 여름이 지나갔어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고, 단풍으로 산의 색갈이 바뀌기 시작하자
교실의 분위기도 달라 지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따라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서너 명씩 교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대로,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대로, 방직공장으로, 가발공장으로,
라디오 공장으로 노예시장에서 노예 팔려 나가듯 그렇게 팔려 나갔던 거에요.
남은 학생들은 추억을 간직한다고 서로 싸인지를 돌리기도 하고,
연락처를 만들어 나눠 갖기도 하면서 부산을 떨었죠.
그렇게 나도 중학교 삼학년이 됐고,
키도 훌쩍 커지고 젖가슴도 제법 처녀티가 나기 시작했죠.
팔 다리부터 얼굴까지 새까맣고, 삐쩍 마르기는 했지만 읍내에서는 예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학생들이 몰래 가방에 편지를 넣어 주기도 하고 개중에는 대문 앞까지 쫓아 오면서 추근대기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경우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전교학생 중에 여자는 사분지 일도 안됐으니까요.
그러니 정선읍내에서 내가 끌던 인기가 어땠었는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여름방학이 돌아오자 나는 어떻게든 쑥골에 가서 지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방학 중에 오빠가 시골집에 다니러 라도 오지 안을까 해서지요.
방학 내내 있지는 안겠지만 그래도 이,삼일 이라도 다녀갈 거 같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 셋을 꼬드겨서 방학 동안 쑥골에 있는 우리 옛날 집에 가서 조용히 공부를 하자고 하였죠.
그 애들은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좀 산다는 집이라도 형제 서,넛이서 한 방을 써야 했고,
틈틈이 가사도 안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니 걔들에게도 꽤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물론 나는 워낙 공부를 못하는 축에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둔 상태였지만요.
아버지한테 졸라서 옛날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졸랐어요.
워낙 공부라고는 접어둔 딸이 공부하겠다는데 말릴 부모 있나요.
그리고 옛날 집도 아버지가 가끔 다니면서 손을 보아 둔 상태라 우리들이 가도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
외지인이 찾아 오는 동네도 아니고,
동네에는 같이 지내던 어른들이 계시니, 우리들이 가도 잘 돌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쑥골에서의 여름방학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너럭바위 위에는 멍석이 여름 내내 깔려 있었어요.
밤이면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이었으니까요.
낮이면 어른들은 논일 밭일 나가시고, 우리들 차지였죠.
바위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었죠.
멍석 위에 상 하나 펴 놓고 둘러 앉아 공부도 하고 개울에 들어가 물장난도 하면서,
하루 하루 정말 즐거운 날들이었어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상에 둘러 앉으면 나는 슬그머니 빠져 나와 덕수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네 엄마하고, 고추도 따고, 밭에 김도 매고 하면서,
어떻게든 덕수 오빠의 소식을 하나라도 더 얻어 들으려고 했어요.
오빠는 그 때 서울로 가서 청계천에 있는 공구상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아저씨가 워낙 마음이 좋아 야간중학교에 보내 줬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도 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가끔은 용돈도 주시는데 오빠는 그 돈을 모아 대학에 갈 거라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고 있대요.
지금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반에서 수석을 한대요.
가게 방에 다락을 들여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도 일을 하면 별도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대학까지 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방학이 돼도 고향에 올 수 없는 거죠.
오빠가 잘 지낸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한 편 오빠가 대학에 갈 거라는 말은
나에게 묘한 자극을 주었어요.
오빠가 대학에 가면,,,,,, 그러면,,,,,,,,
시골 구석의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겠나 싶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친구들 하고 같이 공부하는 상에 끼어 앉았는데,
공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내가 왜 꼴지에서 헤어나질 못했겠어요.
책만 펴면, 오빠가 서울에 있는 멋진 여자와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
괜히 심통이 나서 애들에게 화도 내보고,
혼자 물가로 가서 두 손으로 물을 퍼서 애들에게 끼얹기도 하고는 했죠.
밤에는 전깃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남수는 혼자 등잔불을 켜놓고 열두 시까지 앉아서 책을 읽고는 했죠.
나머지 셋은 개울에 내려가 옷을 홀랑 벗고 물장난을 하기도 하고,
불룩해진 젖가슴을 서로 만지면서 깔깔거리기도 했어요.
보지에는 제법 털도 자라서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도 했는데,
그 중에 순영이는 유독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잘 때는 꼭 내 옆에 붙어서 자고는 했어요.
모기장을 쳐 놓고 한 방에서 모두 자고 있는데, 순영이 슬그머니 내 손을 잡는 거에요.
나도 같이 꼭 잡아 줬더니, 몸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내 젖가슴 위로 손이 올라 와서는
부드럽게 만져주는데 뿌리치기가 싫더라고요.
내 숨이 천천히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다 들릴 거 같았어요.
순영이 내 손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자고 신호를 보내네요.
다른 애들이 깰까 봐, 조심조심 방을 나서서 느티나무 밑으로 갔어요.
동네 어른들은 이미 다 흩어져 각자 집으로 자러 가고
모기를 쫓기 위해 피워 놨던 화톳불도 이제 거의 다 꺼지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 오르더라고요.
순영이 들고 나온 홑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순영의 얼굴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두 볼을 잡고는 입술을 부딪쳐 오더라고요.
순영의 입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아마 단내라고 하는 걸 거에요.
둘이 서로 혀를 입안으로 밀어 넣고 혀를 굴려보기도 하고 빨기도 하는데 너무 달콤한 거 있죠.
입은 서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두 손은 서로의 젖가슴을 쥐고, 젖꼭지를 비틀었어요.
“으~~음, 으~~음”
누가 들을까 억지로 소리를 죽이면서도 서로의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순영이 몸을 포개오면서 내 젖가슴을 빨아 주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데요.
순영의 손이 내보지를 만지고 크리토리스를 살살 비벼대는데,,,,,,
“끄~~극, 끄~~~~억”
입을 악물고 소리를 죽이려니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순영의 손가락이 보지 구멍을 파고 들려는 거에요.
나는 도리질을 치며 거부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 그 구멍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에요.
순영도 더는 내 보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는 하지 않고, 크리토리스를 비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끄~~~윽,꺼~~~억”
드디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참았던 숨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줌을 찔끔 지린 거 같았는데,,,,,
맥이 쭉 빠지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남지 안 더라고요.
순영은 내 입술에 가볍게 키쓰를 해주고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두 손가락을 자기 보지에 넣고 쑤셔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워낙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하~~~악,하~~~학”
순영의 숨소리가 멎을 듯 해 갈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순영의 젖꼭지를 빨아줬죠.
순영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벌렁 누워 버리데요.
둘이 서로 팔 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니,
반짝거리는 별들이 하늘을 뒤 덮고 있는데 제들이 우리가 한 짓을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낯이 뜨거워 오더라고요.
가빳던 숨이 가라 안는데, 온갖 생각이 몰려오는 거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덕수 오빠가 봤다면,,,,,,
온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갑자기 순영이 미워지데요.
덮고 있던 홑이불을 잡아당겨 둘둘 말아 가지고 방으로 들어 와서는,
머리에 뒤집어 쓰고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두 눈은 퉁퉁 부었는데, 순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더군요.
순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깔거리고,,,,
나는 하루 종일 오빠네 고추 밭에 가서 고추 따는 일을 도왔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 다들 잠이 들고 나면 순영의 유혹은 계속됐고, 나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어요.
순영이 내 보지를 입으로 빨아 주고 혀로 크리토리스를 간질여 줄 때는,
내 숨은 한참씩이나 멎고는 했죠.
나도 순영의 젖가슴을 빨아주고. 내 두 손가락을 순영의 보지에 넣게 까지 되었죠.
그래도 순영의 손가락이 내보지 구멍으로 못 들어 오게 막은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는 했어요.
그렇게 그 해 여름이 지나갔어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고, 단풍으로 산의 색갈이 바뀌기 시작하자
교실의 분위기도 달라 지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따라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서너 명씩 교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대로,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대로, 방직공장으로, 가발공장으로,
라디오 공장으로 노예시장에서 노예 팔려 나가듯 그렇게 팔려 나갔던 거에요.
남은 학생들은 추억을 간직한다고 서로 싸인지를 돌리기도 하고,
연락처를 만들어 나눠 갖기도 하면서 부산을 떨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