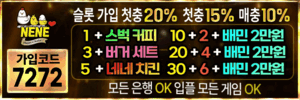암캐 이야기 - 1부 4장
RED TALES # 4
▣ 복종의 약속
거대하게 밀려왔던 오르가슴의 쾌감이 서서히 멀어져가자 아영은 정신이 들었다.
‘걸레! 좋았냐?’ 아영이 몸을 일으키자 남자 아이 중 한 명이 조롱하듯 물었다.
‘......’ 아영은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야, 이 씨팔년아! 좋았냐고!’
남자 아이가 아영의 머리카락을 낚아채자 아영은 비명을 질렀다.
‘대답해!’ 남자 아이는 아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 아영은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명훈이 다가와 아영 앞에 앉았다.
‘확인해보면 되지.’ 명훈은 웃으며 말했다.
명훈은 아영의 턱을 들어 올렸다. 명훈과 아영의 눈이 마주쳤다.
‘분명 좋아할 거야.’ 명훈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명훈은 팔걸이가 달린 의자를 거실로 가지고 나왔다. 명훈은 아영에게 다리를 들어 올려 M자 모양으로 벌리고 의자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영이 자신의 보지를 훤히 드러내고 의자에 앉자 명훈은 가지고 나온 가방을 열었다. 밧줄과 각종 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훈은 아영의 손을 뒤로 돌려 의자에 묶었다. 아영의 다리는 활짝 벌려진 채 의자 팔걸이에 밧줄로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럼 이것부터 제대로 해야겠지?’ 명훈은 아영의 음모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곧 아영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명훈은 아영의 보지에 쉐이빙 크림을 바르고 제모용 칼로 아영의 털을 밀어냈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각사각 털이 잘려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영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영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명훈을 지켜 볼 뿐이었다. 명훈은 다시 한 번 쉐이빙 크림을 바르고 도구를 면도기로 바꿔 깨끗하게 잔털을 깎아낸 후 털이 사라져 매끈하게 된 살에 에프터 쉐이브와 크림을 발랐다. 털이 없어지자 아영의 보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매끈하게 솟아오른 불두덩(두덩, 치구) 아래로 클리토리스가 덮여있고 음순이 조갯살처럼 드러나 있었다.
명훈은 혓바닥을 길게 내밀어 아영의 보지를 위로 핥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영의 항문이 움찔 거렸다. 명훈은 손가락으로 표피를 벗겨내고는 아영의 클리토리스를 혀로 간질거렸다. 아영의 기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명훈은 아영의 보지에서 혀를 뗐다. 아영은 감은 눈을 떴다. 명훈은 아영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해보고 싶은 사람?’ 명훈은 뒤에 서 있는 남자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할께.’ 한 아이가 얼른 아영의 가랑이 사이로 뛰어 들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좋아하지 않는다잖아.’ 명훈은 빈정거리며 말했다.
남자 아이는 마치 키스를 하듯 아영의 보지를 쪽쪽 빨았다. 아영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더니 아영의 몸이 비틀렸다.
‘그만. 좀 쉬어.’ 명훈은 남자 아이의 어깨를 탁치며 말했다.
남자 아이는 아쉬운 듯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섰다. 다섯 명의 소년들은 음란하게 다리를 벌리고 숨을 헐떡이는 동급생의 여고생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아영의 호흡이 고르게 되자 다시 쿤닐링구스(Cunnilingus)는 계속되었다. 아영이 오르가슴 근처에 이르면 명훈의 지시에 따라 쿤닐링구스는 중단 되었다 다시 계속되기를 반복했다.
아영은 미칠 것만 같았다. 터지지 못한 에너지는 몸속에 점점 쌓여져 아영의 몸을 터트릴 것 같았다. 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발.’ 그러나 아영의 입에서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제발? 뭐? 똑 바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명훈은 아영의 귀에 속삭였다.
아영은 원망스러웠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자신이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힐 것인가?
‘제발. 가게 해 줘. 부탁이야.’ 아영은 헉헉거리며 말했다.
‘남자들이 너의 보지를 빨아주니까 좋아? 가고 싶어?’ 명훈은 일어서서 아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좋아. 가고 싶어. 부탁이야.’ 아영은 대답했다.
‘시키는 대로 한다면 들어 줄 수도 있지.’ 명훈이 말했다.
‘할께. 다 할 게. 부탁이야. 가게 해줘.’ 아영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해라.’
‘약속할게.’ 아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틀렸어. 노예답게 부탁하지 않으면 들어 줄 수가 없지. 따라해.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잘 들리지 않는데. 더 크게 말해야지.’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영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따라했다.
부끄러움 따위를 느낄 수 있는 이성이 아영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욕망은 아영의 모든 수치심과 이성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영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자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에이 씨. 더럽게.’ 아영의 보지를 빨던 남자 아이는 얼굴을 손으로 닦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영은 멍한 눈으로 자신의 액체로 더러워진 바닥을 바라보았다. 창피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괜찮아. 마음껏 싸라고.’ 명훈은 그렇게 말하며 아영의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아영의 액체로 이미 더러워진 아영의 보지를 빨았다.
아영을 창피하게 만들었던 부끄러움은 명훈의 혀가 아영의 보지에 닿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아영의 보지에서 다시 한 번 폭포줄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명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영의 보지를 빨았다. 아영은 비명을 질렀다. 아영의 몸이 들썩거렸다. 아영은 어렴풋이 명훈의 혀가 보지를 핥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영은 서서히 짙은 안개처럼 몽롱한 꿈에서 깨어났다.
‘이제 말해 봐. 좋았어?’ 아영이 정신을 차리자 명훈이 차갑게 물었다.
‘좋았어.’ 아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어떤 자존심이 남았단 말인가!
‘암캐 주제에 반말이라니.’ 명훈은 아영의 뺨을 때렸다.
‘암캐는 주인님께 반말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어?’ 명훈은 아영의 턱을 쥐고 소리쳤다.
‘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주인님이라고 말해라. 암캐.’
‘네. 주인님.’
‘넌 나의 노예다. 알겠지?’
‘네. 주인님.’
‘넌 이제부터 나의 소유다.’ 명훈은 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주인님.’ 아영도 명훈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노예는 주인님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네. 주인님.’
‘넌 어떻게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거지?’
‘......’
찰싹. 명훈은 아영의 뺨을 때렸다.
‘넌 어떻게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거지?
‘주인님의 자지를 저의 보지에 넣어주세요.’ 아영은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그걸로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나?’
‘네. 주인님.’
아영은 의자에 묶인 채 다섯 명의 정액을 모두 보지로 받아주었다. 남자 아이들은 미친 듯이 아영의 보지를 탐했고 아영도 남자들의 자지를 탐했다. 아영은 몇 번이나 오르가슴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찮게 느껴졌다. 이런 쾌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노예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영은 알지 못했다. 노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훈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아영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저 한 번 더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기만을 바랄 뿐.
아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기뻐서 인지 슬퍼서 인지 그것은 아영도 알 수 없었다.
─ to be continued ─
▣ 잠깐!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을 꾹!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한 말씀!
격려의 한 마디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루크의 암캐 조교실 : http://cafe.sora.net/kinbaku
▣ 복종의 약속
거대하게 밀려왔던 오르가슴의 쾌감이 서서히 멀어져가자 아영은 정신이 들었다.
‘걸레! 좋았냐?’ 아영이 몸을 일으키자 남자 아이 중 한 명이 조롱하듯 물었다.
‘......’ 아영은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야, 이 씨팔년아! 좋았냐고!’
남자 아이가 아영의 머리카락을 낚아채자 아영은 비명을 질렀다.
‘대답해!’ 남자 아이는 아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 아영은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명훈이 다가와 아영 앞에 앉았다.
‘확인해보면 되지.’ 명훈은 웃으며 말했다.
명훈은 아영의 턱을 들어 올렸다. 명훈과 아영의 눈이 마주쳤다.
‘분명 좋아할 거야.’ 명훈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명훈은 팔걸이가 달린 의자를 거실로 가지고 나왔다. 명훈은 아영에게 다리를 들어 올려 M자 모양으로 벌리고 의자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영이 자신의 보지를 훤히 드러내고 의자에 앉자 명훈은 가지고 나온 가방을 열었다. 밧줄과 각종 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훈은 아영의 손을 뒤로 돌려 의자에 묶었다. 아영의 다리는 활짝 벌려진 채 의자 팔걸이에 밧줄로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럼 이것부터 제대로 해야겠지?’ 명훈은 아영의 음모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곧 아영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명훈은 아영의 보지에 쉐이빙 크림을 바르고 제모용 칼로 아영의 털을 밀어냈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각사각 털이 잘려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영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영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명훈을 지켜 볼 뿐이었다. 명훈은 다시 한 번 쉐이빙 크림을 바르고 도구를 면도기로 바꿔 깨끗하게 잔털을 깎아낸 후 털이 사라져 매끈하게 된 살에 에프터 쉐이브와 크림을 발랐다. 털이 없어지자 아영의 보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매끈하게 솟아오른 불두덩(두덩, 치구) 아래로 클리토리스가 덮여있고 음순이 조갯살처럼 드러나 있었다.
명훈은 혓바닥을 길게 내밀어 아영의 보지를 위로 핥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영의 항문이 움찔 거렸다. 명훈은 손가락으로 표피를 벗겨내고는 아영의 클리토리스를 혀로 간질거렸다. 아영의 기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명훈은 아영의 보지에서 혀를 뗐다. 아영은 감은 눈을 떴다. 명훈은 아영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해보고 싶은 사람?’ 명훈은 뒤에 서 있는 남자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할께.’ 한 아이가 얼른 아영의 가랑이 사이로 뛰어 들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좋아하지 않는다잖아.’ 명훈은 빈정거리며 말했다.
남자 아이는 마치 키스를 하듯 아영의 보지를 쪽쪽 빨았다. 아영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더니 아영의 몸이 비틀렸다.
‘그만. 좀 쉬어.’ 명훈은 남자 아이의 어깨를 탁치며 말했다.
남자 아이는 아쉬운 듯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섰다. 다섯 명의 소년들은 음란하게 다리를 벌리고 숨을 헐떡이는 동급생의 여고생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아영의 호흡이 고르게 되자 다시 쿤닐링구스(Cunnilingus)는 계속되었다. 아영이 오르가슴 근처에 이르면 명훈의 지시에 따라 쿤닐링구스는 중단 되었다 다시 계속되기를 반복했다.
아영은 미칠 것만 같았다. 터지지 못한 에너지는 몸속에 점점 쌓여져 아영의 몸을 터트릴 것 같았다. 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발.’ 그러나 아영의 입에서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제발? 뭐? 똑 바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명훈은 아영의 귀에 속삭였다.
아영은 원망스러웠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자신이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힐 것인가?
‘제발. 가게 해 줘. 부탁이야.’ 아영은 헉헉거리며 말했다.
‘남자들이 너의 보지를 빨아주니까 좋아? 가고 싶어?’ 명훈은 일어서서 아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좋아. 가고 싶어. 부탁이야.’ 아영은 대답했다.
‘시키는 대로 한다면 들어 줄 수도 있지.’ 명훈이 말했다.
‘할께. 다 할 게. 부탁이야. 가게 해줘.’ 아영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해라.’
‘약속할게.’ 아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틀렸어. 노예답게 부탁하지 않으면 들어 줄 수가 없지. 따라해.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잘 들리지 않는데. 더 크게 말해야지.’
‘주인님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한 암캐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영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따라했다.
부끄러움 따위를 느낄 수 있는 이성이 아영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욕망은 아영의 모든 수치심과 이성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영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자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에이 씨. 더럽게.’ 아영의 보지를 빨던 남자 아이는 얼굴을 손으로 닦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영은 멍한 눈으로 자신의 액체로 더러워진 바닥을 바라보았다. 창피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괜찮아. 마음껏 싸라고.’ 명훈은 그렇게 말하며 아영의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아영의 액체로 이미 더러워진 아영의 보지를 빨았다.
아영을 창피하게 만들었던 부끄러움은 명훈의 혀가 아영의 보지에 닿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아영의 보지에서 다시 한 번 폭포줄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명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영의 보지를 빨았다. 아영은 비명을 질렀다. 아영의 몸이 들썩거렸다. 아영은 어렴풋이 명훈의 혀가 보지를 핥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영은 서서히 짙은 안개처럼 몽롱한 꿈에서 깨어났다.
‘이제 말해 봐. 좋았어?’ 아영이 정신을 차리자 명훈이 차갑게 물었다.
‘좋았어.’ 아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어떤 자존심이 남았단 말인가!
‘암캐 주제에 반말이라니.’ 명훈은 아영의 뺨을 때렸다.
‘암캐는 주인님께 반말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어?’ 명훈은 아영의 턱을 쥐고 소리쳤다.
‘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주인님이라고 말해라. 암캐.’
‘네. 주인님.’
‘넌 나의 노예다. 알겠지?’
‘네. 주인님.’
‘넌 이제부터 나의 소유다.’ 명훈은 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주인님.’ 아영도 명훈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노예는 주인님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네. 주인님.’
‘넌 어떻게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거지?’
‘......’
찰싹. 명훈은 아영의 뺨을 때렸다.
‘넌 어떻게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거지?
‘주인님의 자지를 저의 보지에 넣어주세요.’ 아영은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그걸로 주인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나?’
‘네. 주인님.’
아영은 의자에 묶인 채 다섯 명의 정액을 모두 보지로 받아주었다. 남자 아이들은 미친 듯이 아영의 보지를 탐했고 아영도 남자들의 자지를 탐했다. 아영은 몇 번이나 오르가슴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찮게 느껴졌다. 이런 쾌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노예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영은 알지 못했다. 노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훈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아영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저 한 번 더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기만을 바랄 뿐.
아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기뻐서 인지 슬퍼서 인지 그것은 아영도 알 수 없었다.
─ to be continued ─
▣ 잠깐!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을 꾹!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한 말씀!
격려의 한 마디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루크의 암캐 조교실 : http://cafe.sora.net/kinba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