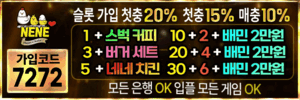2:2 근친의 향연 - 하편
지금 난 민수네 집 앞이다.
민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잠시후 굳게 닫힌 쇠창살 대문이 철커덩 하고 열리더니 민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형 준비됐지?"
"근데 사모님이 날 좋아할까?"
언제부터인가 나한텐 민수엄마가 아닌 사모님이었다.(물주니깐.....)
굳은 결심을 하긴 했는데 떨리는건 어쩔수 없었다.
11월의 초겨울 바람이 이렇게 시린줄 몰랐다.
"걱정마 엄만 열녀야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해"
"그러구 내가 얘기했지, 엄만 밑보지야 그래서 정상체위를 할려면 베게를 허리에 끼워야 되고,
아님 후배위가 좋아"
민수의 경험어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윽고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 중앙에 벽날로가 불을 내뿜고 있었다.
포근했다. 정말로 포근했다.
민수엄만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멀리선 알 수 없었으나 가까이 갈수록 선명한 이목구비가 눈에 드러왔다.
미인이었다. 그러구 첫눈에 반할 정도로 요염한 자태을 풍기고 있었다.
집안에만 있어서인지 피부는 뽀얗다 못해 아주 백인에 가까왔다.
지금이 밤9시가 넘었는데도 얼굴에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곤 짧은 스커트에 흰색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화류계 여자 저리가라 싶을 정도로 섹시했다.
근데 천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만의 묘한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의 느낌일까??? 도도해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암사슴마냥 누군가를 애타고 찾고 있는것 같았다.
"아..안녕하세요"
"민수야 누구니???
"내가 얘기 했잔아 수학선생님 동생......"
"아 난 또 누구라고"
"안녕하세요"
민수엄만 쇼파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심장이 멎는줄만 알앗다.
그렇게 희고 고운손은 첨보았다.
가볍게 악수를 하고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올려보았다.
아찔하게 섹시했다. 조금있으면 그녀를 내품에 앉아 그녀의 ㅂㅈ에 나의 ㅈㅈ를 넣어야 한다......의무적으로
나의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우리 어디에서 할까? 안방에서 아님 여기서???"
그녀가 지금 얘기하는게 나랑 섹스를 하잖 얘긴가???
"무슨 소린지.....?
"민수 너 얘기 안했니??"
"아 형 왜그래 갑자기"
"뭐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하고...."
"형 왜그래 정말"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그녀는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옆에서 민수가 옆구리를 꾹꾹 쑤셔댄다.
뒷모습마저 그렇게 섹시할 수 없었다.
엉덩이는 알맞게 통통했으며 스커트 사이로 비치는 허벅진 황홀 그 자체였다.
난 그녈 뒤따라 드러갔다.
"형 홧팅"
뒤에서 민수가 주먹을 쥐어보이며 응원을 했다.
안방에 드러서자 온통 분홍빛이었다.
조명에 가구에 심지어 침대까지 분홍색이었다.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묘한 기분이란 정말로 짜릿한 쾌감이었다.
사이드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피아노 위에 걸터 앉으며 스커트를 들어올렸다.
팬티도 분홍색이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녀는 멀쭘히 서있는 나를 잡아 끌며 나의 손을 그녀의 흰색 허벅지위에 올려 놓았다.
"난 후배위가 조은데...."
그녀는 그러면서 나의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검붉은 나의 ㅈㅈ를 보더니.....
"이놈 너무나 하고 싶었나 보네 벌써 쌀거 같아"
하더니 나의 ㅈㅈ 귀두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정말이지 ㅈㅈ는 터질거 같았다.
그녀의 가벼운 키스는 계속 되엇다.
그러더니 불알 끝을 입에 넣고 오물거렷다.
첨엔 좀 아프다는 느낌도 들었으나 짧게 전해저 오는 고통이 긴 여운이 돼어 나를 휘감는다.
난 더이상 주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녈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러곤 그녀의 속내 깁숙히까지 빨아댔다.
입술은 말라오고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려 내린다.
어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정도로 아듯하다.
그녀의 눈은 강하게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난 그녀의 하이얀 목덜미에 입술을 댄다.
그녀의 목에선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혀는 달콤했고, 유방은 사발 한종지 업어놓은거 마냥 앙증맞았다.
가끔 짧게 전해지는 그녀의 신음은 나를 더
민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잠시후 굳게 닫힌 쇠창살 대문이 철커덩 하고 열리더니 민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형 준비됐지?"
"근데 사모님이 날 좋아할까?"
언제부터인가 나한텐 민수엄마가 아닌 사모님이었다.(물주니깐.....)
굳은 결심을 하긴 했는데 떨리는건 어쩔수 없었다.
11월의 초겨울 바람이 이렇게 시린줄 몰랐다.
"걱정마 엄만 열녀야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해"
"그러구 내가 얘기했지, 엄만 밑보지야 그래서 정상체위를 할려면 베게를 허리에 끼워야 되고,
아님 후배위가 좋아"
민수의 경험어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윽고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 중앙에 벽날로가 불을 내뿜고 있었다.
포근했다. 정말로 포근했다.
민수엄만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멀리선 알 수 없었으나 가까이 갈수록 선명한 이목구비가 눈에 드러왔다.
미인이었다. 그러구 첫눈에 반할 정도로 요염한 자태을 풍기고 있었다.
집안에만 있어서인지 피부는 뽀얗다 못해 아주 백인에 가까왔다.
지금이 밤9시가 넘었는데도 얼굴에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곤 짧은 스커트에 흰색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화류계 여자 저리가라 싶을 정도로 섹시했다.
근데 천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만의 묘한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의 느낌일까??? 도도해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암사슴마냥 누군가를 애타고 찾고 있는것 같았다.
"아..안녕하세요"
"민수야 누구니???
"내가 얘기 했잔아 수학선생님 동생......"
"아 난 또 누구라고"
"안녕하세요"
민수엄만 쇼파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심장이 멎는줄만 알앗다.
그렇게 희고 고운손은 첨보았다.
가볍게 악수를 하고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올려보았다.
아찔하게 섹시했다. 조금있으면 그녀를 내품에 앉아 그녀의 ㅂㅈ에 나의 ㅈㅈ를 넣어야 한다......의무적으로
나의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우리 어디에서 할까? 안방에서 아님 여기서???"
그녀가 지금 얘기하는게 나랑 섹스를 하잖 얘긴가???
"무슨 소린지.....?
"민수 너 얘기 안했니??"
"아 형 왜그래 갑자기"
"뭐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하고...."
"형 왜그래 정말"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그녀는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옆에서 민수가 옆구리를 꾹꾹 쑤셔댄다.
뒷모습마저 그렇게 섹시할 수 없었다.
엉덩이는 알맞게 통통했으며 스커트 사이로 비치는 허벅진 황홀 그 자체였다.
난 그녈 뒤따라 드러갔다.
"형 홧팅"
뒤에서 민수가 주먹을 쥐어보이며 응원을 했다.
안방에 드러서자 온통 분홍빛이었다.
조명에 가구에 심지어 침대까지 분홍색이었다.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묘한 기분이란 정말로 짜릿한 쾌감이었다.
사이드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피아노 위에 걸터 앉으며 스커트를 들어올렸다.
팬티도 분홍색이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녀는 멀쭘히 서있는 나를 잡아 끌며 나의 손을 그녀의 흰색 허벅지위에 올려 놓았다.
"난 후배위가 조은데...."
그녀는 그러면서 나의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검붉은 나의 ㅈㅈ를 보더니.....
"이놈 너무나 하고 싶었나 보네 벌써 쌀거 같아"
하더니 나의 ㅈㅈ 귀두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정말이지 ㅈㅈ는 터질거 같았다.
그녀의 가벼운 키스는 계속 되엇다.
그러더니 불알 끝을 입에 넣고 오물거렷다.
첨엔 좀 아프다는 느낌도 들었으나 짧게 전해저 오는 고통이 긴 여운이 돼어 나를 휘감는다.
난 더이상 주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녈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러곤 그녀의 속내 깁숙히까지 빨아댔다.
입술은 말라오고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려 내린다.
어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정도로 아듯하다.
그녀의 눈은 강하게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난 그녀의 하이얀 목덜미에 입술을 댄다.
그녀의 목에선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혀는 달콤했고, 유방은 사발 한종지 업어놓은거 마냥 앙증맞았다.
가끔 짧게 전해지는 그녀의 신음은 나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