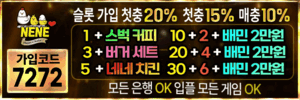조금 울고, 많이 닦던 날들

나는 눈물이 많은 종자였다. 이런 날 보고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그리 눈물이 헤프면 고추 떨어져 인마!” 라며 자주 꾸짖곤 했다. 어쩜 저리 잔인할 수 있는가, 당신의 고추로 인하여 세상의 빛을 본 자식의 고추를 썩어 문드러져 당장에라도 떨어질 것처럼 폄하하다니, 잔인한 아버지라 생각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버지에게 혼이 난 날은 습관처럼 자기 전에 고추를 확인하고 주물렀다. 주물럭주물럭, 무럭무럭 자라라 나의 고추야, 비비적비비적, 아, 사타구니가 조여 온다. 이러다 쪼그라들겠어, 으악, 혹시나 사라졌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아랫도리를 확인하면, 있어야 할 고추는 당연히 있었다. 휴, 깊은 안도감을 내쉬며 잠들던 유년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유년시절의 자위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여자였다. 유난히 나의 고추를 좋아했던 그녀는 틈만 나면 나의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가능하다면 나의 고추를 배양하여 건네고 싶을 정도였다. 하루는 나의 물건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해져 넌지시 물었다. “너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추 때문이냐?” “응” 경멸이 가득 담긴 눈초리가 느껴졌는지 그녀는 배시시 웃더니 “네 거는 포경을 안 한 거라서 만지면 느낌이 좋단 말이야, 보들보들한 감촉이 너무 귀엽고 좋아! 그리고 네 얼굴이랑 뭔가 닮아서 좋아!”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내 얼굴이 좆 같다는 거구나.
그러나 내 얼굴이 거시기처럼 생겼든 내 거시기가 나랑 닮았든, 그녀는 있는 힘껏 나를 사랑해주었다. 단 둘만의 장소라면 그녀는 가리지 않고 나에게 섹스를 요구했다. 아니 고추를 요구했다. 보여 달라고, 만지게 해 달라고, 빨게 해 달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안돼, 라고 말하려는데 귀여운 나의 고추가 그녀의 입 속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 여자가 나의 언어마저도 흡입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젖무덤에 내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가 입으론 나의 고추를 삼키고, 가슴으론 나의 손을 삼키고 있었다. 아랫도리에 고인 쾌감이 이내 범람했다. 깊이가 남다른 여자였다. 여러 가지 의미로.
섹스의 분출은 펑하고 쉽게 터져버리지만, 애틋한 눈물로 얼룩진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허나 한 때의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눈물이 불편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오랜 시간을 들여 정독하는 것이 나에겐 참을 수 없는 권태였다. 나의 고추를 귀여워하던 그녀는 나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었다. 그녀가 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녀와 나의 밤은 짧아져만 갔다. 이러한 기우뚱한 균형이 지속되자 그녀와 나의 만남은 쉽게 청산되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난 뒤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았다. 다만 유년시절의 자위행위를 떠올리며 고추를 만지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상했다. 그녀를 만나 떠올렸던 행위를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떠올리다니, 그 날부터 나는 적게 울고, 많이 닦았다.
육체적 만족감만으로 여자를 찾던 날들이 지나면 가슴속엔 메울 수 없는 빈곤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나는 많이 울어야 했고, 좀 더 축축한 관계에 젖어 들었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섹스의 흥분을 받아내 주는 여자보다 눈물을 닦아주는 여자가 더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