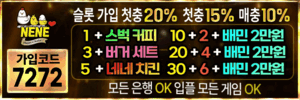[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저번 시간에는 사물화로 진입하는 단계를 거창하게 설명해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본격적인 섭 -혹은 인간-의 사물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클리쉐란 상투어구를 말하며, SM에도 흔히 표현되는 대표적인 이미지(혹은 행위)들이 존재하고, 섭의 동물화와 사물화가 그 중 일부다, 라고 한다면 대략 복습은 끝났다. 사물화된 인간은 무심하게 이용되는 객체가 되고, 이것은 가학/피학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일례로 다음의 사진을 보자.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482372.jpg)
사진 속의 두 여성은 전등의 일부로, 혹은 액세서리 행세를 하고 있다. 두 여성은 아무래도 이 SM적인 장난이 즐거운 모양이다. 여유 있는 얼굴로 웃고 있다. SM이 종종 상류층의 오락, 내지는 한 번 해볼 만한 레저 정도로 인식되는 구미에서는 가학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비교적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SMer들의 플레이 모습을 다룬 다음 사진은 좀 더 진지하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2](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493684.jpg)
엎드려 있는 여성 섭의 등 위로 재떨이가 올라가 있다. 이로써 남성 돔이 담뱃재를 떠는 동작은, 재떨이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와 비교해 한결 더 수월해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여성들은 남성 돔이 흡연을 하기 위한 도구의 일부로 격하되어 있다. 그녀는 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단지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할 뿐이다. 전편에서 말했던 능동성, 움직임, 의지 등의 제거야말로 섭의 사물화 행위의 핵심이며, 그것은 인간이 가장 낮은 단계로 격하되고 가장 확실한 객체-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3](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02905.jpg)
이 여성은 양 손에 초를 받쳐 드는 인간촛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학자에게 있어 피학자는 일상적인 오브제, 더 심할 경우에는 배경이 된다. 다음의 이미지의 여성도 역시 사물로써, 그녀는 한 그루의 크리스마스트리가 되어 있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4](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12393.jpg)
지금까지의 이미지들로 보면 인간의 사물화는 그다지 하드코어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물이야말로 어떤 방식으로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금덩어리는 매우 귀한 물건이지만 그래도 역시 물질에 불과하다. 이라크전에서 후세인의 아방궁에 들이닥친 미군(과 그들과 동행한 언론사 스태프)이 공개한 후세인의 화장실을 생각해보라. 금으로 되어 있는 변기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한 독재자의 비정상적인 사치벽이지, 후세인의 배설물에 의해 모욕 받은 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간이 변기로 쓰이고 있는 다음의 다소 조잡한 CG 이미지에서 인간변기의 값어치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5](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22117.jpg)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6](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31326.jpg)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7](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40162.jpg)
‘PeeBowl(오줌그릇)’로 명명된 이 물체는 ‘파티의 필수품’, ‘단돈 59.99 달러’라는 문구로 선전되고 있다. 소변을 보는 남성이나 그 소변을 받는 여성이나 모두 무감정해 보인다. 남성에게 변기는 변기일 뿐이므로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고, 변기는 변기대로 물질에 불과하므로 감정이나 의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다음의 사진의 수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8](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50283.jpg)
사진 속의 여성은 단지 운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들고 날라야 할 짐일 뿐이다.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인지 머리는 삭발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터벨트와 하이힐 차림인 것을 보면 아마 그녀는 섹스토이인 모양이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9](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59262.jpg)
사디즘의 원형이자-말이 원형이지 실제로는 한 형태에 불과하다.- 사디즘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된 사드 후작(Marquis de Sade)의 소설을 보면 어린 소녀가 침대와 식탁으로 사용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타인을 ‘유용한’ 사물-특히 가구-로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고전적인 가학의 테마 중 하나다. 가학/피학의 감정이 인간 생활에 뿌리내린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SM 이미지에 주목해왔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사물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여성의 신체를 가구로 표현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국의 팝 아티스트 앨런 존스(allen jones)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0](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68569.jpg)
알렌 존스(Allen Jones), [모자 걸이, 테이블, 의자], 1969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1](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78006.jpg)
[의자]의 세부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2](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86862.jpg)
[탁자]의 세부
이것은 실재하는 여성은 아니고 마네킹이지만 충분히 사실적이고 대담하다. 그가 이 작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특히 여성들, 그 중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여성비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 작품은 외형적으로 여성들에게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여성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여성이었더라면 이 작품을 보고 아마도 무척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팝아트는 기본적으로 <예술적으로 정제된 것>이 아닌 <대중문화 속에 흐르는 요소>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이다. 나는 앨런 존스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이런 작품을 발표했다, 는 것이 전부다. 어쨌거나 나는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흥분했다. - 물론 성적인 흥분이었다.
전편에서 이야기한 파졸리니처럼, 나는 앨런 존스 역시 변태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작품 활동에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여성비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욕망에 솔직한 대담한 아티스트일 뿐이다. 어쨌든 예술가는 자신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주제라야 작품에 더 열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저엔 얼마든지 성적 흥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이힐, 부츠, 라텍스에 페티시를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작품들이 자신의 그런 성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자. 사물은 쓰고 버리고 소모할 수 있는 대상이다. 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전시할 수도 비치할 수도 있지만 성적 유희와 편리를 위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조작을 가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섭의 신체 자체를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사진에서는 섭의 몸을 그림판 삼아 가벼운 장난질을 하고 있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3](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596332.jpg)
다소 저질스런 장난이다. 아랫도리를 가지고 코끼리 놀이를 하는 것은 보통 남자들이나 하는 짓이며, 그것도 그다지 고상하지 못한 일이다.(관습적으로는 말이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성의 몸에 아무렇게나 그런 장난을 쳐 놓았다. 그것도 민망한 물건에 속하는 초대형 딜도를 동원해서. 물론 이것은 소프트한 이미지다. 나의 경우 섭의 나신에 립스틱이나 수성매직 따위로 모욕적인 문구를 썼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거야 어찌 됐든 이제부터는 섭의 신체를 조작하는 다소 하드한 이미지를 감상해보자.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4](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60541.jpg)
펜치가 유두를 죄어오고 있다. 차갑고 무감정한 기계와 살아있는, 부드러운 신체의 대비 - SM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은 공격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깝고, 고문이라기보다는 개조에 가깝다. 몇 초 후 저 유두가 어떻게 될 지를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 실제로 하드코어적인 이미지를 올려볼까도 했으나, 바늘이 피가 흐르는 클리토리스를 통과하는 따위의 이미지는 표현수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SM에는 ‘신체개조’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이 존재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SM커플이 D/s 관계를 맺으면 돔은 서서히 섭의 몸을 자신의 취향대로 개조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SMer들에게 피어싱이나 니들(바늘 플레이) 등 출혈이 생기고 영구적인 흔적이 남는 플레이는 기피대상 1호다. 덧붙여 스캇 등 배설물에 관련된 것이 기피대상 2호이고. 여하튼 다음의 사진은 표현수위의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것이다.
![[real BDSM] 인간이 사물이 되는 방식들 이미지 #15](https://ddaltime166.com/data/file/know/15904196614816.jpg)
이용에서 조작까지, SM에서 사물화된 인간의 신체는 타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거기에 신체의 본래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즉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잔인하고 엽기적인 SM 하드코어는 사물화된 섭, 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 나의 예전 섭은 다치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 잘 관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컨대 그녀의 몸은 나의 것이고, 따라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런 상황을 즐겼다. 미셸 푸코와 다른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란 바로 신체의 자유를 말한다. 지적인 농담꾸러기인 움베르토 에코 조차도 이런 논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다. 신체의 자유를 저당잡히는 것이야말로 피지배의 근본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 신체가 타인의 목적을 위해 소비될 때 말이다.